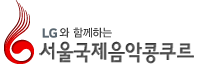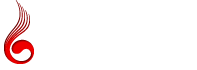[객석] 예쁜 타건, 올곧은 태도 이 청년을 주목하라
작성자
admin_concours2
작성일
2008-11-28 14:14
조회
693
2008 서울국제음악콩쿠르 3위 입상 피아니스트 김태형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끝났다. 우선 3위 입상이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 1, 2차 예선과 결선을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서울에서 열렸다는 게 장점이었다. 따로 적응할 필요도 없었고 학교 앞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라 익숙한 분위기에서 칠 수 있었다. 후배들이 와서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인터넷을 통해서도)이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다. 음악만 생각해야 하는데 심적 부담이 있었단 얘기다. 점점 올라갈수록 한국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었고.
1차 예선 때 바흐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생상스 '죽음의 춤'을 쳤는데 일부러 대비되는 캐릭터를 넣었다. 바흐에서는 원래 하프시코드를 염두에 둔 곡이니까 바로크적인 해석, 생상스에서는 쇼 피스적인 걸 보여주고 싶었다. 2차에서는 모차르트 등 고전소나타를 쳐야했고 리스트 '순례의 해' 중 '오베르만 계곡'이랑 스크랴빈 소나타를 쳤는데,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려 애썼다. 분위기는 여느 콩쿠르에 비해 자유로웠다. 에튀드도 칠 필요가 없었고.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격려가 참 고마웠다. 예전에 그냥 넘겼던 말들도 가슴에 와 닿을 때가 많았다.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다.
결선을 지켜봤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봤는데, 꽤 예쁘게 친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쁘게 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해석의 기준이나 철학이 있었다면?
예쁘게 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철학까지는 아니었다. 2악장 같은 경우는 봄의 새 시작을 알리는 느낌 등의 뉘앙스를 살리고 싶었지 심오하게 내면적으로 보여줄 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느껴지는 분위기나 연주했을 경우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질 효과, 크게 연주해야겠다... 정도는 있었다.
리허설 때보다 연주 떄 훨씬 더 즐기면서 쳤다. 일단 곡 자체가 즐겨야만 잘 표현되는 곡이기 때문에....
롱 티보, 하마마츠 등 세계적인 콩쿠르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롱 티보처럼 홈스테이를 하면 참가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하맘마츠 같은 경우는 같은 호텔에 묵으니까 그만큼 어울릴 수가 있다. 동지 같은 느낌이 든다. 힘들 때 같이 있으니까. 난 그 어울림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일단은 몇십 년 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맥을 쌓고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좋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번 콩쿠르에서는 집이 멀어서 참가자들과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
코리안 심포니의 반주는 어땠나?
지휘자 박은성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2악장(차이코프스키)에서 문제를 겪는 부분이 있었다. 꽤나 안 맞았었는데, 내 탓이었다. 그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해줘서 네 번 맞춰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가. 다른 나라의 콩쿠르 갔을 때와는 다른 배려,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었다.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있었나?
다른 사람 연주를 보러 다니지 못한 편이다. 집이 정릉이니까 왕복 3시간이다. 인터넷으로 대충 보고 대개 후배들에게 많이 들었다. 누가 어떻게 친다더라 하고.
준결선에 60분 시간 제한이 있었다. 제한을 넘기면 종을 친다는 거다. 계산을 대충해보니까 60분 임박해서 칠 것 같아서 오버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 65분을 넘을 경우 종을 치게 되어 있었다. 별 것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졸였다. 브람스 소나타 3번이었는데, 65분을 넘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종은 한번도 울리지 않았다.
이번 콩쿠르를 통해 본인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만의 어떤 것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런 연주자가 청중과 훨씬 교류하기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은 리히테르나 길렐스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직접 들은 나는 라두 루푸나 페라이어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했다.
여러가지 성격을 골고루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나만의 색채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피아니스트 평생의 목표가 아닐까 한다.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니까.
강충모 선생님이 콩쿠르 전후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다.
별 말씀 없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레슨 받았고 그 시간 안에 많이 쳐야 했다. 연주 직전에 심사위원들 같이 오셔서 만나 뵈었을 때 그냥 '잘해라' 외에 말씀은 없었다.
신경이 많이 쓰일 줄 알았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선 선생님이 앉아 계시다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물론, 그렇다고 더 편할 리도 없었지만.
방금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에 다녀왔다. 반주자로서 연주해보며 어떤 점을 느꼈나?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를 처음 맞췄는데, 잘 맞더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대단한 열정이 느껴졌다. 실내악 연주를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한다. 5월 9일 상하이에서 듀오 콘서트 공연했고, 11일에도 세종체임버홀에서 듀오 콘서트를 했는데 솔로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실내악은 함께 공유할 뭔가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남는게 많다.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한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
계속 힘들다(웃음). 가장 힘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콩쿠르 막바지다. 지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움직여야 할 때만 움직인다. 그리고 배가 안 고파도 기운 내기 위해 밥 먹는다. 이번엔 서울에서 콩쿠르 해서 좀 나았는데, 어쨌든 계속 힘들다(웃음).
본인은 섬세함, 디테일을 중시하지 않나?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나?
물론 성격 때문일 것이다. 꼼꼼한 A형이다. 결벽증은 없지만(사실은 되게 지저분하다). 별것 아닌데 상처도 많이 받곤 한다.
자신이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무래도 대범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부족하다. 그쪽이 많이 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성에 안 찬다.
콩쿠르 처음 나가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음악, 연주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귀가 얇으면 '이 콩쿠르는 정치적이래' '여긴 이런 부분이 안 좋대' 등등 떠다니는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생각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 아무리 정치적이고 최악의 콩쿠르라도 음악만을 생각하는 태도가 더 도움이 된다.
글_류태형 기자 / 사진_서울국제음악콩쿠르
월간 객석 auditorium. 2008. 6월호
Interview (Page 90)



서울국제음악콩쿠르가 끝났다. 우선 3위 입상이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한다. 1, 2차 예선과 결선을 거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은?
서울에서 열렸다는 게 장점이었다. 따로 적응할 필요도 없었고 학교 앞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라 익숙한 분위기에서 칠 수 있었다. 후배들이 와서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인터넷을 통해서도)이 부담으로 다가오긴 했다. 음악만 생각해야 하는데 심적 부담이 있었단 얘기다. 점점 올라갈수록 한국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었고.
1차 예선 때 바흐 반음계적 환상곡과 푸가, 생상스 '죽음의 춤'을 쳤는데 일부러 대비되는 캐릭터를 넣었다. 바흐에서는 원래 하프시코드를 염두에 둔 곡이니까 바로크적인 해석, 생상스에서는 쇼 피스적인 걸 보여주고 싶었다. 2차에서는 모차르트 등 고전소나타를 쳐야했고 리스트 '순례의 해' 중 '오베르만 계곡'이랑 스크랴빈 소나타를 쳤는데,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려 애썼다. 분위기는 여느 콩쿠르에 비해 자유로웠다. 에튀드도 칠 필요가 없었고.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줄 수 있었다. 주위 사람들의 격려가 참 고마웠다. 예전에 그냥 넘겼던 말들도 가슴에 와 닿을 때가 많았다. 도움을 참 많이 받은 것 같다.
결선을 지켜봤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봤는데, 꽤 예쁘게 친다는 인상을 받았다. 예쁘게 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나? 해석의 기준이나 철학이 있었다면?
예쁘게 친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 철학까지는 아니었다. 2악장 같은 경우는 봄의 새 시작을 알리는 느낌 등의 뉘앙스를 살리고 싶었지 심오하게 내면적으로 보여줄 곡은 아니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느껴지는 분위기나 연주했을 경우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전해질 효과, 크게 연주해야겠다... 정도는 있었다.
리허설 때보다 연주 떄 훨씬 더 즐기면서 쳤다. 일단 곡 자체가 즐겨야만 잘 표현되는 곡이기 때문에....
롱 티보, 하마마츠 등 세계적인 콩쿠르와 비교해 봤을 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특징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롱 티보처럼 홈스테이를 하면 참가자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하맘마츠 같은 경우는 같은 호텔에 묵으니까 그만큼 어울릴 수가 있다. 동지 같은 느낌이 든다. 힘들 때 같이 있으니까. 난 그 어울림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일단은 몇십 년 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맥을 쌓고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어 좋다.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번 콩쿠르에서는 집이 멀어서 참가자들과 생각을 공유할 기회가 적어 아쉬웠다.
코리안 심포니의 반주는 어땠나?
지휘자 박은성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2악장(차이코프스키)에서 문제를 겪는 부분이 있었다. 꽤나 안 맞았었는데, 내 탓이었다. 그 부분에 배려를 많이 해줘서 네 번 맞춰볼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하다. 팔이 안으로 굽지 않는가. 다른 나라의 콩쿠르 갔을 때와는 다른 배려, 어드밴티지라고 할 수 있었다.
에피소드나 해프닝이 있었나?
다른 사람 연주를 보러 다니지 못한 편이다. 집이 정릉이니까 왕복 3시간이다. 인터넷으로 대충 보고 대개 후배들에게 많이 들었다. 누가 어떻게 친다더라 하고.
준결선에 60분 시간 제한이 있었다. 제한을 넘기면 종을 친다는 거다. 계산을 대충해보니까 60분 임박해서 칠 것 같아서 오버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 65분을 넘을 경우 종을 치게 되어 있었다. 별 것 아니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졸였다. 브람스 소나타 3번이었는데, 65분을 넘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종은 한번도 울리지 않았다.
이번 콩쿠르를 통해 본인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내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나만의 어떤 것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런 연주자가 청중과 훨씬 교류하기 쉽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본인은 리히테르나 길렐스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직접 들은 나는 라두 루푸나 페라이어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했다.
여러가지 성격을 골고루 시험하고 있는 중이다. 나만의 색채를 찾는 것은 어찌 보면 피아니스트 평생의 목표가 아닐까 한다. 커리어는 이제 시작이니까.
강충모 선생님이 콩쿠르 전후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하다.
별 말씀 없었다. 바쁜 시간 내주셔서 레슨 받았고 그 시간 안에 많이 쳐야 했다. 연주 직전에 심사위원들 같이 오셔서 만나 뵈었을 때 그냥 '잘해라' 외에 말씀은 없었다.
신경이 많이 쓰일 줄 알았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선 선생님이 앉아 계시다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됐다. 물론, 그렇다고 더 편할 리도 없었지만.
방금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과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에 다녀왔다. 반주자로서 연주해보며 어떤 점을 느꼈나?
프랑크 바이올린 소나타를 처음 맞췄는데, 잘 맞더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대단한 열정이 느껴졌다. 실내악 연주를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한다. 5월 9일 상하이에서 듀오 콘서트 공연했고, 11일에도 세종체임버홀에서 듀오 콘서트를 했는데 솔로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실내악은 함께 공유할 뭔가가 있어서 끝나고 나서도 남는게 많다. 앞으로도 많이 하려고 한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나?
계속 힘들다(웃음). 가장 힘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콩쿠르 막바지다. 지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움직여야 할 때만 움직인다. 그리고 배가 안 고파도 기운 내기 위해 밥 먹는다. 이번엔 서울에서 콩쿠르 해서 좀 나았는데, 어쨌든 계속 힘들다(웃음).
본인은 섬세함, 디테일을 중시하지 않나? 어디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나?
물론 성격 때문일 것이다. 꼼꼼한 A형이다. 결벽증은 없지만(사실은 되게 지저분하다). 별것 아닌데 상처도 많이 받곤 한다.
자신이 보강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아무래도 대범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부족하다. 그쪽이 많이 늘기는 한 것 같은데, 아직 성에 안 찬다.
콩쿠르 처음 나가는 후배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잘 준비해서 음악, 연주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귀가 얇으면 '이 콩쿠르는 정치적이래' '여긴 이런 부분이 안 좋대' 등등 떠다니는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생각해봤자 별 이득이 없다. 아무리 정치적이고 최악의 콩쿠르라도 음악만을 생각하는 태도가 더 도움이 된다.
글_류태형 기자 / 사진_서울국제음악콩쿠르
월간 객석 auditorium. 2008. 6월호
Interview (Page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