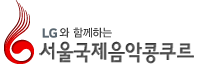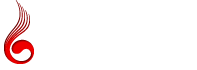[동아일보]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차예선을 보고
작성자
admin_concours2
작성일
2007-11-28 13:13
조회
105

기품이 스며든 목소리 풍성
성악계 ‘미래’가 여기 모였다
꺼져 버린 불씨를 다시 살려 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라는 된서리를 맞았던 동아국제음악콩쿠르가 서울국제음악콩쿠르로 이름을 바꾸어 10년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반갑게 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다. 단절이라는 벽을 깨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무려 30개국에서 139명의 참가자가 몰려들었다는 보도에도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경연이 시작되면서 그 안개는 걷혀 갔다. 예상이 좋은 쪽으로 뒤집힌다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일인데, 경연자들의 수준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더더욱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목소리의 질과 그 품격이었다.
별안간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나 인문학의 껍질만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다. 물기(物氣)에 젖은 사람들이 문기(文氣)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아우성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추락의 시대, 저속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되바라진 목소리가 무대에 범람하고 그 천기(賤氣)가 넘쳐야 갈채를 받았다. 그 천기의 휘황한 꽃이 루치아노 파바로티였다. 그런 판에 누가 기품에 찬 목소리로 노래하려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서울국제음악콩쿠르의 첫 경연자인 바리톤 김주택은 격조 높은, 기품에 찬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것이 내게는 커다란 충격이었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셰익스피어는 말한다. 엘리엇은 그것을 뒤집어 ‘결말은 이미 그 시작 속에 내재돼 있다’고 말한다. 그의 목소리는 이 콩쿠르의 방향을 예감케 했고 그것은 참으로 반가운 겨울 햇살이었다.
그 밖에도 흐뭇한 일은 많았다. ‘다듬어진 불량품보다는 다듬어지지 않은 가능성을 택하겠다’고 볼테르는 말한다. 그 볼테르라면 마음에 들었을 법한 경연자가 적지 않았다는 것도 이 콩쿠르의 발전성과 앞날에 대한 밝은 청신호일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끝이 좋았다는 점이다. 1차 예선 마지막 연주자였던 멕시코의 가르시아카노는 절제력이 탁월하면서도 끓어오르는 열기가 휘황했다. 끝이 좋으면 또한 모든 것이 좋은 법이다.
이틀간의 1차 예심에서 총 24명의 2차 예선 진출자가 가려졌다. 탄탄한 역량을 지닌 이들이 12월 1, 2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펼칠 2차 예선은 그래서 더욱 주목된다.
문화란 필요할 때만 잠깐 분장했다가 아무 때나 지워버리는 화장품이 아니다. 대지 깊숙한 곳에서 숙성되어 다시 그 땅에 짙게 젖어들 때만 제대로 발효될 수 있는 포도주와도 같다. 주최 측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예술계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이 콩쿠르를 가장 알찬 국제음악콩쿠르로 가꾸어 온 세계에 그 열매가 뿌려지는 날을 고대한다.
이순열 음악평론가·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동아일보 2007. 11. 30(금)
donga.com에서 보기